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올해는 한반도 정전 60주년인 해입니다. 남북은 반세기를 훌쩍 넘긴 지금도 반 토막 으로 갈라져 대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념으로 분단된 동독과 서독은 현재 통일된 하나의 민족으로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오늘은 독일 즉 도이칠란트 현지 교민들이 말하는 통일과 그 이후 삶에 대해 알아봅니다.
도이칠란트는 인구 8천3백만 명으로 남북한 크기 1.6배가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 하에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동과 서로 분단이 됐다가 1990년 하나의 국가로 통일 됐습니다. 기자가 방문한 곳은 도이칠란트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 프랑크푸르트. 이곳에는 한국교민이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개성이 고향인 김영상 박사. 1998년과 2003년 그리고 지난해 북한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김 박사는 은퇴 후 현재 프랑크푸르트 시에 있는 한국 문화회관 이사로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앓고 있는 당사자로서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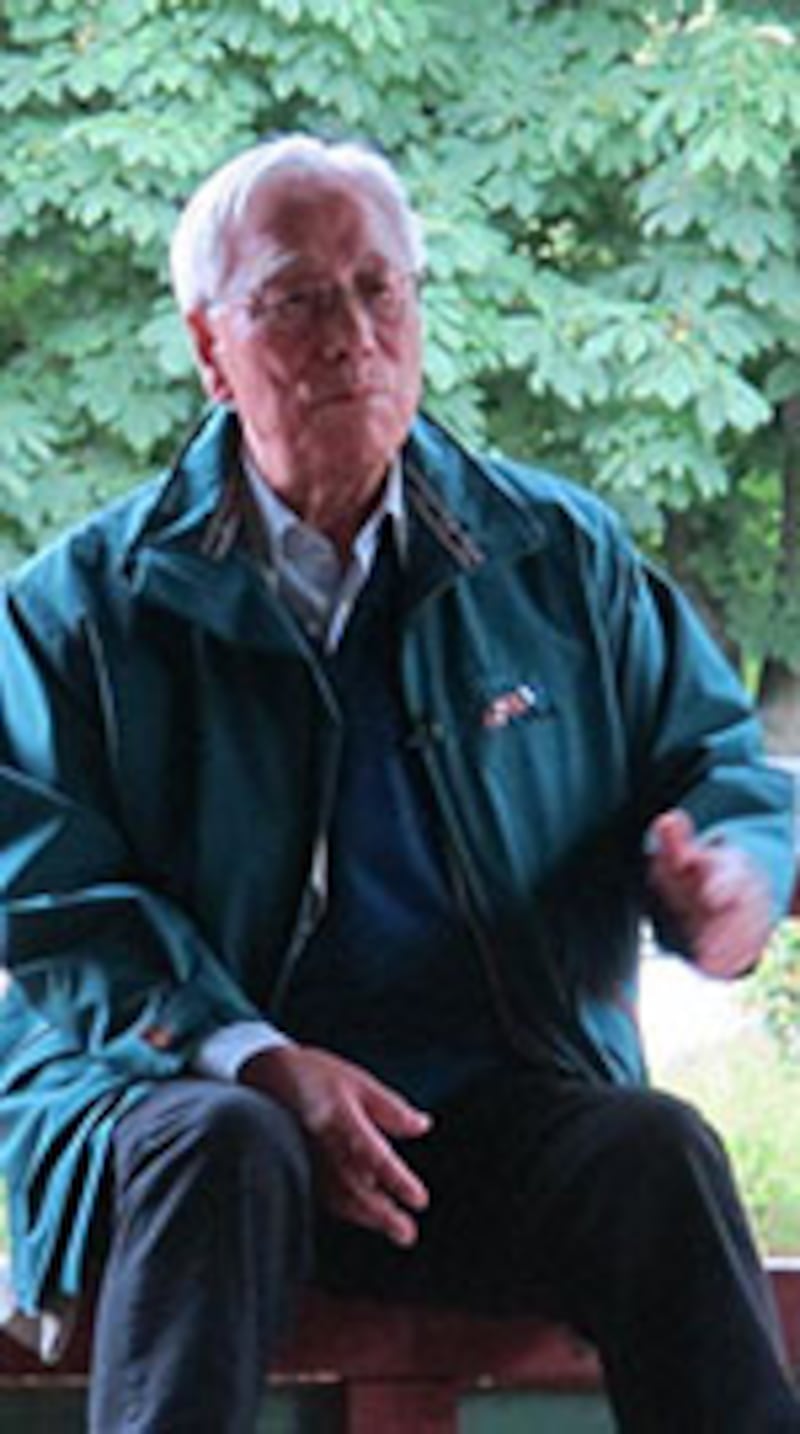
김영상: 여기 신문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매년 적어진다 하는데 이것은 갈라지는 겁니다. 모르니까...
기자: 분단조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김영상 박사: 북쪽에서는 남한을 세계에서 가장 미워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가장 마음이 아파요. 좀 바라는 것이 우선 급히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말로 평화로운 말로 대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기자: 독일 통일 당시 현지에 사셨고 지금도 살고 계신데 독일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김영상 박사: 다들 만족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서쪽은 대부분이 70%-80%좋은 결과였다고 보면서도 아직까지 부담되는 통일 비용으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동독 쪽은 옛날에 잘살던 1세대들의 불평이 아주 많습니다. 그때는 하지 못했던 말들은 자유세계인 지금은 할 수 있으니까 말합니다. 동독 시절이 좋았다. 무너진 이유는 있겠지만 그 사상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20년 정도 지나 2세대 3세대가 나오면 없어지겠지만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동쪽이다 너는 서쪽이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이칠란트에 사는 많은 수의 한국 교민은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 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간호사나 광부로 국가 차원에서 이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환갑을 맞아 젊은 시절 땀 흘렸던 만큼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노후를 맞고 있습니다.
홍순자 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독대한간호사회 회장 홍순자예요. 제가 1970년에 왔으니까 43년을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 살고 있어요. 독일 통일 23년이 됐는데 처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던 독일이 지금은 완벽하게 자릴 잡고 세계 강대국이 되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나라도 통일이 돼서 한민족으로 단합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1966년 간호사로 이주한 문영희 씨입니다.
문영희 교민: 저희가 여기 온 1966년에 대학 나와서 밑바닥 생활하려고 여기 오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 와 이곳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22살이었는데 6개월 만에 너무 울어서 눈 밑에 주름이 졌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믿질 않는데 저는 거짓말을 조금은 하지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도이칠란트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은 동독 사람들에 의해 1989년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음해 구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 되면서 하나의 국가를 선포합니다.
교민1: 1990년 10월3일 독일의 통일이 한국 개천절 날과 같습니다. 국경일입니다. 2010년까지 20년 동안 통일 비용이 약 3천조가 들어갔습니다. 매년 50조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소비성이 아니라 베를린을 갈 때 도로가 안 좋았는데 이런 부분 즉 기간시설에 투자한 겁니다. 구동독과의 소득 균형을 이루기 위해 모든 국민이 통일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겁니다.
도이칠란트 통일 당시 인구는 서독이 동독보다 3배 많았고 경제규모는 서독이 동독의 두 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한 인구는 남한이 북한의 두 배, 경제규모는 북한의 3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 도이칠란트 통일과 비교 볼 때 북한은 구 동독보다 인구는 더 많지만 경제 상황은 나쁘니 통일 이후 남쪽이 북한 경제를 끌어 올리는데 들어가는 통일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깁니다. 남북한 통일 이후의 모습은 도이칠란트 현지 교민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교민2: 통일이 되고 나니까 동독에 있던 분들이 서독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동독 대학병원에 있던 분들이 많이 왔었는데 서독 의사 분들과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과제만 가지고 일했지만 서독 교수님들은 창의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돈을 쓸 때도 동독 교수님들은 안 쓰려고 했지만 서독 교수님들은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동독 분들은 권위적인 반면 서독 분들은 개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길이 달랐던 것을 한길로 다시 모으려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경제적인 지출도 뒤따랐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한반도 정전 60주년에 즈음해 도이칠란트 통일이 주는 교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