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거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북한과 우호 관계를 맺었던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과 경제·외교적 관계를 끊거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벨지끄) 브뤼셀 자유대학과 미국 스팀슨센터는 3일 북한과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이예프 국립대학의 고호윤 조교수는 북한이 구 소련이 붕괴된 1991년 이후 사회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잇따라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현재 중앙아시아 내 정치, 경제적인 전략 거점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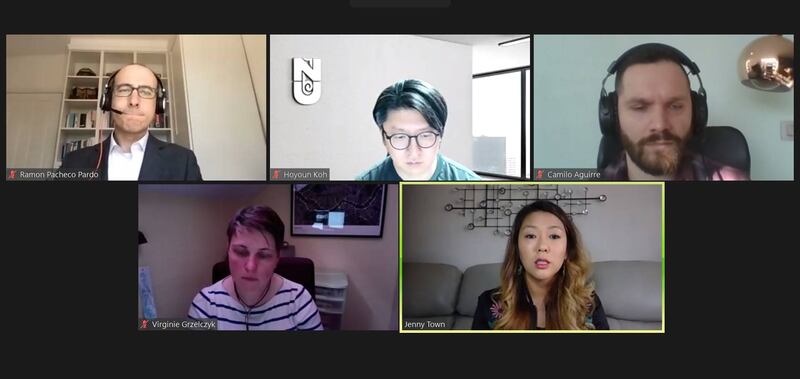
고 교수는 특히 2010년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본격화되고, 이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미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북한과 단교하거나 이름 뿐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카자흐스탄과 1992년 수교했지만 1998년 카자흐스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철수했고, 이후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사관을 중앙아시아 거점 공관으로 운영했지만 이마저도 북한 핵실험 이후 2016년 폐쇄됐습니다.
고 교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과 북한 중 정치·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한국을 선택했고, 대북 경제적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을 배제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2000년 초부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비자까지 발급하면서 북한 내 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고호윤 교수: 북한이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유치하려는 투자는 정부를 통한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북한은 고려인들과 강한 연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고 교수는 북한이 중앙아시아에서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성공한 고려인들에게 경제 투자 유치를 바라고 있지만 대북제재에 따른 위험으로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다만 2018년 리용호 당시 북한 외무상의 투르크매니스탄 방문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또 다른 토론자였던 영국 아스톤 대학교의 버지니 크젤렉(Virginie Grzelczyk) 부교수는 1950~60년대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북한이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에 여전히 불법 무기를 수출하고 군사훈련 등을 제공하며,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3월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단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국제제재 감시망을 피해 우간다 등 우호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에 선박 또는 항공기로 군사용 장비나 무기 밀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젤렉 교수는 현재 대북제재로 인한 국제사회 고립 심화로 중국 외 우호국이 없는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새로운 파트너, 즉 협력국으로 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자금줄이 막힌 북한이 생존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추적과 감시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운 연구원: 이들 관계는 정부 간이 아닌 개인 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습니다. 또 대부분은 정부에 자세하게 보고되지 않습니다.
한편 카밀로 아기레 토리노(Camilo Aguirre Torrini) 칠레대학교 연구원은 대북 압박이 거세지면서 2017년 멕시코, 페루 등이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등 미국의 영향력이 큰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이 대북 외교관계 단절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2019년 베네수엘라가 평양에 대사관을 개관하는 등 오히려 외교관계를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거나 브라질이 북한 대사관 운영을 허용하는 등 여전히 일부 남미 국가들과 북한이 외교관계를 이어가고 평가했습니다.
